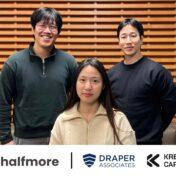《라라랜드》를 본 사람 모두가 하는 말이라 나까지 나서야 하나 싶었지만, 역시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이 영화는 아름답습니다. 꿈꾸듯 춤추듯 찬란합니다. '컨트롤 A'를 눌러 이 영화의 모든 걸 갖고 싶었습니다.
'《위플래쉬》 감독의 신작'이라는 이름으로 영화를 접한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앞으론 데미언 샤젤 감독의 영화 포스터에 '《위플래쉬》와 《라라랜드》 감독'이라는 수식어가 오래도록 따라다니겠죠? 재즈에 대한 숭배, 꿈을 쫓는 인물들, 유려한 카메라 동선과 숨 가쁜 호흡. 두 영화는 닮은 점이 많습니다. 그 중엔 두 주연 간의 '멘토-멘티 관계'도 있습니다.
《위플래쉬》는 알겠는데 사랑 영화인 《라라랜드》에 웬 멘토냐고 물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서배스천(라이언 고슬링 분)과 미아(에마 스톤 분)의 관계도 연인인 동시에 '멘토-멘티'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배스천이 늘 미아의 곁에서 '경적을 울려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미아의 집앞에서 경적을 울리는 서배스천을 보고 룸메이트가 묻습니다.
항상 저렇게 할 거래?
미아는 수줍게 웃으며 답합니다.
그럴 거 같아.
이 대사처럼 서배스천은 늘 미아의 곁에서 경적을 울려주었습니다. 사실 첫 만남부터 그랬죠. 꽉 막힌 도로 위에서 미아는 오디션 대본을 읽습니다. 열중한 나머지 앞차가 출발하는 것도 모르죠. 뒤에서 얼른 가라고 서배스천의 차가 경적을 지릅니다. 옆 차선으로 갈아타고 나서도 경적으로 한바탕 욕을 퍼붓고 갑니다.

이 영화에서 '차'는 삶에 대한 은유로 활용됩니다. 꽉 막힌 도로 위에 느닷없이 펼쳐진 황홀한 군무의 환상으로 오프닝에서부터 이걸 예고했죠. 수많은 차들로 꽉 막힌 도로는 모든 이들이 한곳을 향해 몰려가는 경쟁 사회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오디션에 또 떨어지고, 미아는 기분이 엉망이 됩니다. 설상가상 파티 후에 타고 돌아갈 차도 견인되고 말았습니다. 미아는 지금 갈 길이 막막합니다. 지친 발걸음으로 터벅터벅 무작정 걷습니다. 지나온 길과 가야 할 길 한가운데 멈춰 서서 한숨을 쉽니다.
그러다 흘러나오는 서배스천의 연주를 듣습니다. 미아는 단번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피아노 선율은 지금 자신의 처지를 알아주었습니다. 지치고 갈 길 잃은 미아의 삶에 서배스천은 그렇게 문득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은 다음 파티장에서 다시 마주칩니다. 돌아갈 때 서배스천은 미아의 차 열쇠를 찾아줍니다. 하나같이 똑같아 보이는 수많은 프리우스 중에서 미아의 차를 움직여줄 키를 찾아서 건네줍니다. 미아가 주차해놓은 곳을 찾지 못하자 차를 찾는 방법을 알려주기도 하죠.
이때 서배스천이 알려준 건 차를 더 빨리 찾을 수 있지만, 그만큼의 대가를 감수해야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서배스천은 "리모컨을 머리에 대고 버튼을 눌러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머리가 안테나 역할을 해서 차를 더 빨리 찾게 될 거라고. 그렇지만 그만큼 생명이 단축될 거라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꿈을 쫓는 자들이 겪어야 할 대가를 떠올리게 하는 장면입니다.

서배스천은 늘 그랬습니다. 언제나 미아의 곁에서 경적을 울려주었습니다. 오디션을 도중에 끊고, 연기하는 사람 앞에서 폰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자들에게 휘둘리지 말라고. 꿈을 쫓는 사람의 가치를 진지하게 대하지 않는 자들을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합니다. 미아가 자신만의 극을 써서 무대에 올리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용기를 북돋습니다.
지칠대로 지쳐 다 포기하고 고향에 내려갔을 때도 또다시 찾아가 경적을 울립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뭐하는 짓이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서배스천만은 언제고 다시 미아를 찾아가 정체된 꿈에 경적을 울려줍니다. 미아에게 서배스천은 아름다운 꿈을 계속 쫓도록 이끌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멘토'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청춘'이나 '열정'이라는 단어가 싫어진 이유와 마찬가지로, 의미가 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만든 건 스스로 '멘토'를 자처하는 사람들입니다. 제대로 사업 한 번 해본 적 없는 사람들이 소위 '창업연구소' 같은 이상한 이름을 달고 멘토를 자처합니다. 이래야 하고 저래야 한다며 자기도 확실히 모르는 말들을 무책임하게 늘어놓습니다.
그런 말들을 듣고 있으면 미셸 시망의 말이 생각납니다. "영화라는 종합예술의 어느 한 축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영화평론을 하는 반지성주의가 횡행하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스타트업의 어느 한 부분도 제대로 겪어본 적 없는 자들이 멘토를 자처하는 모습을 보면 당혹스럽습니다. 물론 세상엔 멘토 소리 들어 마땅할 훌륭한 분들이 더 많이 계시지만요.

서배스천이 미아의 멘토일 수 있었던 이유는 말하는 바를 그 자신의 삶을 통해 직접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전통 재즈를 숭배하며 결코 타협하지 않는 서배스천의 모습을 보면서 미아는 1인극을 올릴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서배스천이 말로만 이래라저래라 떠들었다면 그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진정한 멘토란 어때야 할까?"라는 질문에 대한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멘토들의 삶은 멋있습니다. 마치 영화 속 서배스천처럼요. 망설이는 사람에게 경적을 울려서 계속 앞으로 가게 해줍니다. 너의 앞엔 길이 있다고, 지치고 힘들겠지만, 지금처럼 계속 앞으로 가면 된다고 알려줍니다. 멘토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멋진 조언을 하려면 먼저 자신의 삶에 대해 오랜 기간 질문을 품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영화 이미지 ⓒ Summit Entertai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