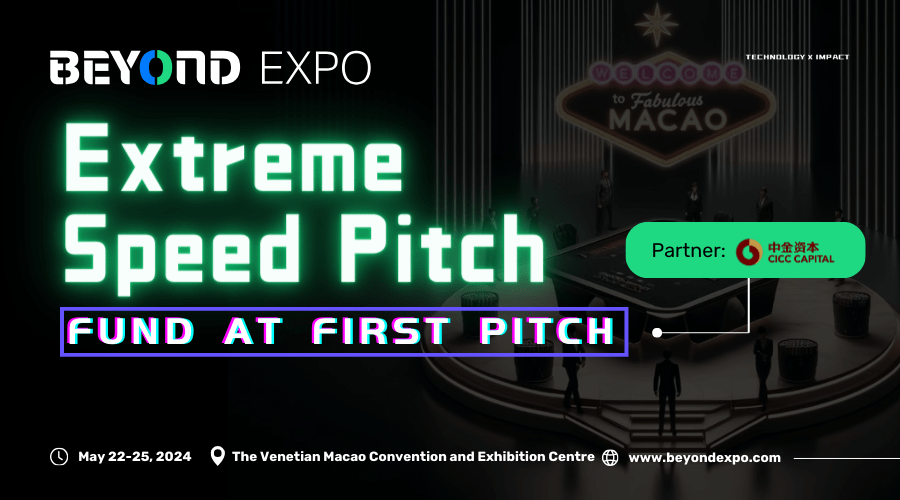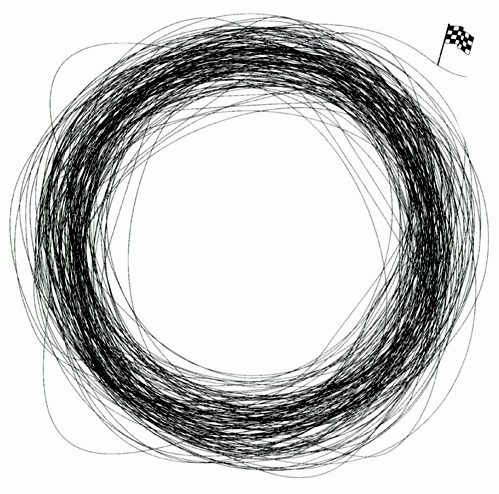
스타트업 분야의 철학서 《린 스타트업》 표지에는 원 하나가 그려져 있습니다. 처음의 원 위로 다시 수많은 원을 덧대 완성한 하나의 원입니다. 언젠가 출발했을 선은 수없이 돌고 돌아 확고한 하나의 동그라미, 혹은 굳은 의지를 남겨놓고 결승 깃발로 퇴장합니다.
이 표지는 책이 말하려는 바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실행·측정·학습'의 회전을 강조한 에릭 리스(Eric Ries)의 철학이 담겨있죠. '흰 바탕의 원 하나'로 표현한 이미지는 마치 그가 강조한 'MVP(Minimum Viable Product, 최소 기능 제품)'처럼 경쾌하고 경제적입니다. 원의 완성을 위해 그려나간 무수히 많은 회전의 궤적에는 의지가 배어있습니다.
그의 말처럼 스타트업의 작동 원리는 회전일 수 있습니다. 빠르게 실행하고, 부족함을 알게 되고, 개선하는 일련의 과정이 꼬리를 물고 돕니다. 그 회전을 동력으로 우리는 전진합니다. 수많은 작은 실패와 성공이 회전하며 조금씩 앞으로 갑니다. 회전은 더디게 시작하지만 일단 처음의 몇 바퀴를 돌고 나면 가속이 붙습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엔진이 뜨겁게 달궈집니다.
아니, 한번 멀리 가볼까요. 어쩌면 회전은 세상의 작동원리일 수도 있습니다. 태초를 있게 한 건 탄생과 죽음이라는 고리였습니다. 생과 사의 응축으로 형성된 행성은 자전하고 공전합니다. 그 행성 주위를 순환하는 위성을 타고 내려가면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사회 안에서도 무언가 끊임없이 돕니다. 자본이 돌고, 지배권력이 회전합니다. 역사는 상식과 비상식의 교대 반복, 혼돈과 안정의 무한 반복으로 쓰입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의 몸 안에선 혈액이 돌고 있습니다. 혈액세포를 구성하는 원자 안에서도 원심력을 따라 전자가 회전합니다.
우린 유기체 속의 적혈구처럼, 회전하는 자동차를 타고 출근해 하루를 반복합니다. 1초, 1분, 1시간, 1일, 1주일, 1달, 1년이 그렇게 회전합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세상은 137억 년이라는 허무에 가까운 시간 동안 잠시도 쉬지 않고 돌고 또 돌았습니다.

이게 갑자기 무슨 '회전 회오리 슛하는 소리'냐고 하실 것 같네요. 머리가 돌아버릴 것 같은 얘기는 이쯤에서 그만하겠습니다. 회전에 관해 말을 꺼낸 건 오늘 영화가 《트레인스포팅》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화는 '회전을 거부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영화 속 인물들은 세상의 회전을 경멸합니다. "인생을 선택하라, 직업을 선택하라, 가족을 선택하라, 대형 TV도 선택하라. 세탁기, 차도 선택하고 CD 플레이어와 병따개도 선택하라." 이런 냉소적인 내레이션으로 영화는 시작됩니다. 그리고선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며 세상에 '가운뎃손가락'을 먹입니다.
세상은 한사코 이들에게 회전에 동참할 것을 강요합니다. 이들은 기어이 도주합니다. '기성세대의 정상적인 삶의 방식'을 경멸하며 세상의 회전을 유지해줄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약 빨고', 춤추고, 법을 어기며 체제를 거부하죠. 이들의 도주를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은 앨리슨과 식보이의 아기(아마도)가 헤로인을 먹고 사망하는 씬입니다. 물론 사고였지만, 새 생명을 돌보는 일조차 등한시하는 이들은 애초에 세상의 회전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달리기를 지켜보는 동안 관객은 조금씩 이들의 반항 이유를 수긍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 일종의 해방감을 느끼게 됩니다. 영화에서 달리기(도주)로 표현된 세상에 대한 반항은 결국엔 무척 아름답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이 정도까지 순수하게 무모하면 숭고해지는 걸까요. 누군가 묻겠죠. 아니 회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리곤 어떻게든 돌리려고 할 것입니다. 끝내 이들이 회전에 합류하지 않으면 다른 누가 그 몫의 회전을 감당하는 방식으로 사회를 유지할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건 꽤나 이상한 일입니다. 우린 이미 구축된 이데올로기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으면서도 그걸 충실히 따르며 살아갑니다. 세상이 다급하게 변하고 있는데 기성세대는 자꾸만 옛날 방식을 강요합니다. 자신들이 해온 방식을 따라 하라고 말합니다. 옛날엔 사회도 기술도 의식도 정서도 지금과는 크게 달랐는데도 말이죠. 틀을 정해놓고 "내가 그랬으니 너도 그러면 잘 될 거"라고 말하지만, 결과를 보면 그 틀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트레인스포팅》의 달리기를 보고 해방감을 느끼는 이유는 '정상적인 삶의 방식'이라는 궤변에 관객들도 시달려봤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곧이곧대로 들을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뭘 해도 망한다"며 한국을 '헬조선'이라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 누군가의 말대로 어차피 망할 거라면 저는 하고 싶은 거 하다가 망하렵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 웬일인지 망하기보다 점점 더 좋아지는 일도 생기는 거 같네요. 소위 '그딴 거 하고 앉아있는 사람'의 결과는 모르는 거 아닌가요? 그딴 거 하고 앉아있는 그곳이 로켓 좌석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저는 결국 스타트업이 기성세대의 기준에서는 말도 안 되는 성과를 낼 수 있는 이유도 그들의 기준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성세대와 다른 방식, 다른 접근법으로 일하기 때문에 결과물도 다를 수 있는 거라고 말이죠. 그래서 스타트업이 좋습니다. 실제로 스타트업은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요. 스타트업을 하는 건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도 회전을 거부하는 멋진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영화 이미지 ⓒ Miramax